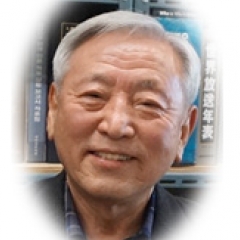[권영상 작가님] 박주가리의 빛나는 여행
[권영상 작가님] 박주가리의 빛나는 여행
by 권영상 작가님 2022.03.10

바람이 분다.
처마 끝에 매달아 둔 풍경이 쟁그랑거린다. 봄바람이다. 바람은 들판의 추위가 설핏 풀리면서 시작됐다. 멀리 거제도로 여행을 간 친구는 그쪽의 봄을 찍어 보냈다. 이쪽에선 꼼짝 않는 매화꽃이 그쪽에선 한창이다. 사람은 매화꽃 사진으로 봄을 알지만 대지는 이미 봄을 느끼고 있다. 생명 활동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다는 뜻이다.
하던 일을 놓고 창밖을 내다본다. 바람이 여기저기로 몰려다닌다.
그 바람 속에 반짝이며 둥둥 떠다니는 것들이 보인다. 은실 깃털들이다. 창을 열고 내다보니 집 남쪽 모퉁이에서 바람을 타고 몰려나온다. 점심 끝에 무 한 덩이를 꺼내려고 텃밭 무구덩이에 나가며 보니 마루 틈 사이에, 으아리 마른 덩굴에 그 반짝이던 은빛 깃털들이 걸려있다. 놀랍게도 그 끝에 까만 씨앗이 매달려 있다.
그들이 날아온 발원지가 사철나무를 휘감고 살던 박주가리, 그 씨앗 주머니다. 오늘에야 알았는데 이들이 박주가리 씨앗이었다. 박주가리는 표주박처럼 생겼는데 마르면 반 쪼가리로 갈라진다고 해 생긴 이름이다. 쪼개어진 박주가리 씨앗 주머니엔 하얀 은실이 차곡차곡, 마치 바늘쌈 속의 실바늘처럼 가지런히 가득 들어있다. 바람이 불어올 적마다 씨앗들은 접힌 낙하산을 펼치듯 은실 깃털을 펼치고 날아오른다.
유유히 뜰마당을 지나 들녘으로 날아가는 풍경이 낯설다.
신비로운 것이 자연이다. 신이 박주가리 씨앗을 이렇게 만드셨다, 하면 놀랄 일도 없겠다. 하지만 박주가리가 이 세상을 살아내기 위해 스스로 표주박 모양의 주머니를 만들고, 그 안에 가볍고 빛나는 은빛 깃털을 지어 한 알씩 씨앗을 매달아 날려보내는 이 일은 너무도 신비롭다. 가까이할수록 생명의 생존 본능은 경이롭기까지 하다.
겨울 동안 온몸을 가볍게 만든 박주가리는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살아갈 영토를 마련하기 위해 멀리 떠난다. 부모 곁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부모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야 한다. 어쩌면 이른 봄은 박주가리 씨앗들이 그들이 살던 터전을 떠나는 작별의 시간이며,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저 반짝임은 눈부신 이별의 손짓일지 모른다.
나는 마른 나뭇가지에 걸린 박주가리 씨앗을 집어 바람에 날려 올린다. 기왕 그렇게 살도록 되어있으니 어디 먼 곳 좋은 땅에 내려앉아 새 삶을 시작하기를 빈다. 그러나 그건 나의 바람일 뿐 정처 없이 날아가는 박주가리 씨앗의 운명을 나는 알 수 없다. 그들은 바람에 몸을 의탁할 뿐 가는 곳을 모른다. 가다가 길을 잃어 삭막한 땅이나 흙 한 점 없는 지붕 위나, 시멘트 바닥에 떨어진다면 그건 불행이다.
그건 인생이라는, 길 위에 선 여행자의 운명과도 같다. 우리는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을 언제 조금이라도 미리 알기나 했는가. 조그마한 시골에서 태어나 숱한 방황 끝에 여기 이곳에 오기까지의 일을 나는 조금치도 알지 못했고, 여기 이곳에 정착하기 위해 겪은 수많은 고충 또한 나는 미리 알지 못했다.
여행이란 길을 잃기 위해 떠나는 여정이라는 말이 맞는다면 맞을 것도 같다. 박주가리의 생애나 인간의 생애나 삶의 출발은 길을 잃은 그 자리에서 시작된다. 거기서부터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시작된다. 살아내기 위한 몸부림, 그것이 인생이며 인생은 그것 때문에 빛난다.
박주가리 씨앗을 실어 나르는 봄바람이 그치지 않는다. 그 바람이 있어 박주가리의 생애 또한 대대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처마 끝에 매달아 둔 풍경이 쟁그랑거린다. 봄바람이다. 바람은 들판의 추위가 설핏 풀리면서 시작됐다. 멀리 거제도로 여행을 간 친구는 그쪽의 봄을 찍어 보냈다. 이쪽에선 꼼짝 않는 매화꽃이 그쪽에선 한창이다. 사람은 매화꽃 사진으로 봄을 알지만 대지는 이미 봄을 느끼고 있다. 생명 활동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다는 뜻이다.
하던 일을 놓고 창밖을 내다본다. 바람이 여기저기로 몰려다닌다.
그 바람 속에 반짝이며 둥둥 떠다니는 것들이 보인다. 은실 깃털들이다. 창을 열고 내다보니 집 남쪽 모퉁이에서 바람을 타고 몰려나온다. 점심 끝에 무 한 덩이를 꺼내려고 텃밭 무구덩이에 나가며 보니 마루 틈 사이에, 으아리 마른 덩굴에 그 반짝이던 은빛 깃털들이 걸려있다. 놀랍게도 그 끝에 까만 씨앗이 매달려 있다.
그들이 날아온 발원지가 사철나무를 휘감고 살던 박주가리, 그 씨앗 주머니다. 오늘에야 알았는데 이들이 박주가리 씨앗이었다. 박주가리는 표주박처럼 생겼는데 마르면 반 쪼가리로 갈라진다고 해 생긴 이름이다. 쪼개어진 박주가리 씨앗 주머니엔 하얀 은실이 차곡차곡, 마치 바늘쌈 속의 실바늘처럼 가지런히 가득 들어있다. 바람이 불어올 적마다 씨앗들은 접힌 낙하산을 펼치듯 은실 깃털을 펼치고 날아오른다.
유유히 뜰마당을 지나 들녘으로 날아가는 풍경이 낯설다.
신비로운 것이 자연이다. 신이 박주가리 씨앗을 이렇게 만드셨다, 하면 놀랄 일도 없겠다. 하지만 박주가리가 이 세상을 살아내기 위해 스스로 표주박 모양의 주머니를 만들고, 그 안에 가볍고 빛나는 은빛 깃털을 지어 한 알씩 씨앗을 매달아 날려보내는 이 일은 너무도 신비롭다. 가까이할수록 생명의 생존 본능은 경이롭기까지 하다.
겨울 동안 온몸을 가볍게 만든 박주가리는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살아갈 영토를 마련하기 위해 멀리 떠난다. 부모 곁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부모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야 한다. 어쩌면 이른 봄은 박주가리 씨앗들이 그들이 살던 터전을 떠나는 작별의 시간이며,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저 반짝임은 눈부신 이별의 손짓일지 모른다.
나는 마른 나뭇가지에 걸린 박주가리 씨앗을 집어 바람에 날려 올린다. 기왕 그렇게 살도록 되어있으니 어디 먼 곳 좋은 땅에 내려앉아 새 삶을 시작하기를 빈다. 그러나 그건 나의 바람일 뿐 정처 없이 날아가는 박주가리 씨앗의 운명을 나는 알 수 없다. 그들은 바람에 몸을 의탁할 뿐 가는 곳을 모른다. 가다가 길을 잃어 삭막한 땅이나 흙 한 점 없는 지붕 위나, 시멘트 바닥에 떨어진다면 그건 불행이다.
그건 인생이라는, 길 위에 선 여행자의 운명과도 같다. 우리는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을 언제 조금이라도 미리 알기나 했는가. 조그마한 시골에서 태어나 숱한 방황 끝에 여기 이곳에 오기까지의 일을 나는 조금치도 알지 못했고, 여기 이곳에 정착하기 위해 겪은 수많은 고충 또한 나는 미리 알지 못했다.
여행이란 길을 잃기 위해 떠나는 여정이라는 말이 맞는다면 맞을 것도 같다. 박주가리의 생애나 인간의 생애나 삶의 출발은 길을 잃은 그 자리에서 시작된다. 거기서부터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시작된다. 살아내기 위한 몸부림, 그것이 인생이며 인생은 그것 때문에 빛난다.
박주가리 씨앗을 실어 나르는 봄바람이 그치지 않는다. 그 바람이 있어 박주가리의 생애 또한 대대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