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섭 시인님] 밥의 힘
[이규섭 시인님] 밥의 힘
by 이규섭 시인님 2022.0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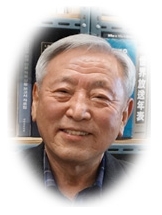
기껏 싸준 도시락을 남편은 가끔씩 산에다 놓아준다/ 산새들이 와서 먹고 너구리가 와서 먹는다는 도시락
애써 싸준 것을 아깝게 왜 버리냐/ 핀잔을 주다가/ 내가 차려준 밥상을 손톱만 한 위장 속에 그득 담고/ 하늘을 나는 새들을 생각한다
내가 몇 시간이고 불리고 익혀서 해준 밥이/ 날갯죽지 근육이 되고/ 새끼들 적실 너구리 젖이 된다는 생각이/ 밥물처럼 번지는 이 밤
은하수 물결이 잔잔히 고이는/ 어둠 아래/ 둥그런 등 맞대고/ 나누는 한솥밥이 다디달다
<문성해 ‘한솥밥’ 전문>
문성해가 지은 밥은 들짐승과 날짐승에게 전해져 ‘한솥밥’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날갯죽지 근육이 되고 새끼들 적실 너구리의 젖’이 되어 생명을 보듬는다. 밥 지은 이의 마음이 남편의 도시락을 통해 또 다른 생명과 한솥밥을 공유하며 자연을 품는다.
한솥밥을 짓던 어머니의 밥상이 그립다. 저세상으로 이별 여행 떠난 지 60년 됐으니 그리움조차 아득하다. 보리쌀을 삶아 솥 밑바닥에 깔고 그 위에 쌀을 얹은 보리밥을 쓱쓱 비벼 먹으며 여름을 났다. 겨울엔 쌀 위에 좁쌀이나 잡곡을 얹은 혼합 밥에 구수한 된장과 김치면 족했다. 둥근 소반에 빙 둘러앉아 어머니의 손맛과 정성을 먹었다. 가마솥에 나무로 지은 밥은 특별한 반찬이 없어도 밥맛을 냈다.
무쇠로 만든 가마솥 뚜껑의 무게가 고압을 유지해 밥솥의 물기를 날리고 뜸을 들이면 고슬고슬하고 달착지근한 밥이 된다. 그때의 향수를 자극한 상혼이 돌솥밥이다. 갓 지은 돌솥의 밥을 공기에 푼 뒤 물을 부어 뚜껑을 덮어놓으면 숭늉과 누룽밥이 옛 맛을 살린다.
식생활의 다변화로 쌀 소비가 줄었지만 예전엔 쌀밥에 고깃국은 명절이나 제삿날 먹었을 정도로 귀했다. 한국인에게 ‘밥은 하늘’이었고, 밥심으로 살았다. 어렸을 적 한마을에 살던 고모네는 머슴을 두고 농사를 지을 정도로 대농이었다. 일꾼에겐 커다란 사기그릇에 밥을 고봉으로 담아줘 밥심을 실감 나게 했다.
쌀이 귀하던 1960∼70년대는 혼분식장려운동(混粉食奬勵運動)을 펼쳤다. 쌀 소비를 줄이려고 혼식과 분식을 장려했다. 중학교 시절 도시락 검사 땐 보리쌀이나 잡곡이 섞여 있어야 했고, 일주일에 한 번은 분식의 날로 밀가루 음식인 국수나 수제비를 먹도록 권장했다. 1973년엔 표준 식단을 공표하고 이듬해부터 밥은 음식점에서 정해진 규격인 스테인리스 밥공기로만 팔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도 했다. 지름 10.5㎝ 높이 6㎝의 밥공기에 밥은 80%만 담으라고 했으니 참 모진 세월을 살았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밥이 고픈 사람들은 있다. ‘밥퍼나눔운동(밥퍼)’ 공동체가 서울 청량리에서 34년째 노숙인과 노인 등 소외계층에게 무료급식으로 허기를 채워준다. 무료급식소가 증축공사를 하다가 시유지를 무단 사용했다며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사회적 물의가 일자 서울시장과 ‘밥퍼’ 대표가 만나 기부채납 후 사용하는 방식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고발을 취하했다. ‘밥의 힘’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다.
애써 싸준 것을 아깝게 왜 버리냐/ 핀잔을 주다가/ 내가 차려준 밥상을 손톱만 한 위장 속에 그득 담고/ 하늘을 나는 새들을 생각한다
내가 몇 시간이고 불리고 익혀서 해준 밥이/ 날갯죽지 근육이 되고/ 새끼들 적실 너구리 젖이 된다는 생각이/ 밥물처럼 번지는 이 밤
은하수 물결이 잔잔히 고이는/ 어둠 아래/ 둥그런 등 맞대고/ 나누는 한솥밥이 다디달다
<문성해 ‘한솥밥’ 전문>
문성해가 지은 밥은 들짐승과 날짐승에게 전해져 ‘한솥밥’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날갯죽지 근육이 되고 새끼들 적실 너구리의 젖’이 되어 생명을 보듬는다. 밥 지은 이의 마음이 남편의 도시락을 통해 또 다른 생명과 한솥밥을 공유하며 자연을 품는다.
한솥밥을 짓던 어머니의 밥상이 그립다. 저세상으로 이별 여행 떠난 지 60년 됐으니 그리움조차 아득하다. 보리쌀을 삶아 솥 밑바닥에 깔고 그 위에 쌀을 얹은 보리밥을 쓱쓱 비벼 먹으며 여름을 났다. 겨울엔 쌀 위에 좁쌀이나 잡곡을 얹은 혼합 밥에 구수한 된장과 김치면 족했다. 둥근 소반에 빙 둘러앉아 어머니의 손맛과 정성을 먹었다. 가마솥에 나무로 지은 밥은 특별한 반찬이 없어도 밥맛을 냈다.
무쇠로 만든 가마솥 뚜껑의 무게가 고압을 유지해 밥솥의 물기를 날리고 뜸을 들이면 고슬고슬하고 달착지근한 밥이 된다. 그때의 향수를 자극한 상혼이 돌솥밥이다. 갓 지은 돌솥의 밥을 공기에 푼 뒤 물을 부어 뚜껑을 덮어놓으면 숭늉과 누룽밥이 옛 맛을 살린다.
식생활의 다변화로 쌀 소비가 줄었지만 예전엔 쌀밥에 고깃국은 명절이나 제삿날 먹었을 정도로 귀했다. 한국인에게 ‘밥은 하늘’이었고, 밥심으로 살았다. 어렸을 적 한마을에 살던 고모네는 머슴을 두고 농사를 지을 정도로 대농이었다. 일꾼에겐 커다란 사기그릇에 밥을 고봉으로 담아줘 밥심을 실감 나게 했다.
쌀이 귀하던 1960∼70년대는 혼분식장려운동(混粉食奬勵運動)을 펼쳤다. 쌀 소비를 줄이려고 혼식과 분식을 장려했다. 중학교 시절 도시락 검사 땐 보리쌀이나 잡곡이 섞여 있어야 했고, 일주일에 한 번은 분식의 날로 밀가루 음식인 국수나 수제비를 먹도록 권장했다. 1973년엔 표준 식단을 공표하고 이듬해부터 밥은 음식점에서 정해진 규격인 스테인리스 밥공기로만 팔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도 했다. 지름 10.5㎝ 높이 6㎝의 밥공기에 밥은 80%만 담으라고 했으니 참 모진 세월을 살았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밥이 고픈 사람들은 있다. ‘밥퍼나눔운동(밥퍼)’ 공동체가 서울 청량리에서 34년째 노숙인과 노인 등 소외계층에게 무료급식으로 허기를 채워준다. 무료급식소가 증축공사를 하다가 시유지를 무단 사용했다며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사회적 물의가 일자 서울시장과 ‘밥퍼’ 대표가 만나 기부채납 후 사용하는 방식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고발을 취하했다. ‘밥의 힘’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