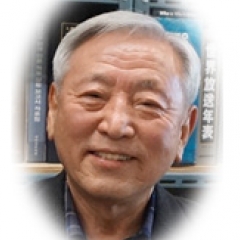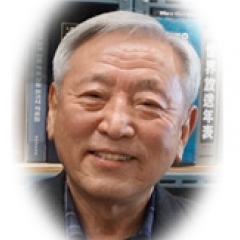[권영상 작가님] 다랑쉬 오름에서 돌아오다
[권영상 작가님] 다랑쉬 오름에서 돌아오다
by 권영상 작가님 2022.02.03

다랑쉬 오름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가 오후 2시.
하늘이 무너질 듯 눈이 내렸다. 눈도 눈도 참 어마어마하게 내렸고, 바람도 바람도 참 소문난 제주 바람답게 불었다.
“이런 날씨론 난 못 올라가. 가려면 당신이나 가.”
아내가 차창 밖으로 휘몰아치는 눈보라를 바라보며 손사래를 쳤다.
혼자라면야 바람에 날려 산비탈에 처박힌다거나 눈길에 미끄러져 변고를 겪는다 해도 오른다면 오르겠다. 근데 곁에 아내가 있다고 생각하니 망설여진다.
한낮인데도 점점 어두컴컴해지고, 지금으로 보아 눈 그칠 기미는 없어 보였다. 나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아니 험한 날씨를 진정시키기 위해 숙소에서 타온 커피 한 잔을 따랐다. 바람과 바람 사이를 틈타 문을 열고 근방에 계실 천지신명께 커피 한 모금을 권했다.
다랑쉬 오름에 오를 계획은 오늘이 아니라 어제다. 국립해녀박물관과 비자림을 둘러본 뒤 숙소로 정한 서귀포로 돌아가는 길에 들를 계획이었다.
근데 제주 공항에 도착하여 날씨 검색을 하면서 일정이 바뀌었다. 둘째 날부터 비와 눈이 내린다고 했다. 불가피하게 둘째 날에 가기로 한 올레 10길을 하루 앞당겼다.
공항에 내리는 대로 산방산을 향해 1시간을 달렸다. 산방산 아래로 펼쳐지는 사계해안길이 눈앞에 삼삼히 아른거렸다. 산방산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해안 길로 나갔다.
바다가 힘들여 찾아온 우리를 덥석 끌어안았다. 파도는 한없이 잔잔하고 날씨는 쾌청했다. 저 건너 형제섬이 어서 오라고 우리를 맞았고, 그 너머 마라도가 반가우이! 아는 체를 했다. 우리는 그들과 나란히 파도가 찰방대는 모래톱을 따라 걷다가, 발자국화석 반연지를 걷다가, 모래 둔덕에 피는 노란 갯국화 곁을 지나다가, 그러다가 우연히 오던 길을 돌아보면 그가 우뚝 서 있었다. 산방굴사가 있는 산방산.
우리의 처음 목표는 이 길을 걸어 두 시간 거리의 송악산을 돌아오는 일이다. 하지만 이 잔잔하고 햇빛 좋은 사계해안을 걸으며 목표를 바꾸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지금 여기를 마지막 목표지점으로 삼았다. 목표를 바꾸고 나자 우리는 조금 전에 지나쳤던 노란 갯국화를 다시 찾아가 어루만져 주고, 발자국 화석을 찾아가 빛나는 초록 이끼를 보아주고, 유리처럼 맑은 파도에 손을 적시며, 장난치며, 놀며, 따사로운 겨울 햇살을 즐겼다.
그러고 숙소로 돌아온 밤부터 함박눈이 내렸다.
눈은 창밖 동백나무숲을 뒤덮고, 그 너머 큰엉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를 틀어막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우리를 더욱 암울하게 하는 게 있었다. 폭설 경보 문자메시지였다.
“내일은 틀렸네 뭐.”
아내가 기어이 참았던 말을 했다.
눈은 그 밤부터 연속적으로 내려 지금까지 내리고 있다.
다랑쉬! 다랑쉬! 하며 제주를 찾아온 내 속을 알았을까. 아니면 한잔 얻어잡수신 커피 때문일까. 눈보라가 약해지는 틈을 타 우리는 다람쥐길 같은 소로를 따라 올랐다.
그 예쁜 달덩이 분화구 앞에 섰을 때다. 기어이 제주 바람이 본색을 드러냈다. 북쪽 들판을 거칠게 달려와 껑충한 나를 분화구 비탈에 집어던졌다. 그 바람은 라 만차 평원에서 풍차 마을로 거칠게 불어오던 돈키호테 바람과 너무도 흡사했다. 비탈의 억새풀을 그러잡지 않았다면 나는 분화구에 빠져 영영 돌아오지 못했을 거다. 아, 제주 바람이여! 다랑쉬여!
하늘이 무너질 듯 눈이 내렸다. 눈도 눈도 참 어마어마하게 내렸고, 바람도 바람도 참 소문난 제주 바람답게 불었다.
“이런 날씨론 난 못 올라가. 가려면 당신이나 가.”
아내가 차창 밖으로 휘몰아치는 눈보라를 바라보며 손사래를 쳤다.
혼자라면야 바람에 날려 산비탈에 처박힌다거나 눈길에 미끄러져 변고를 겪는다 해도 오른다면 오르겠다. 근데 곁에 아내가 있다고 생각하니 망설여진다.
한낮인데도 점점 어두컴컴해지고, 지금으로 보아 눈 그칠 기미는 없어 보였다. 나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아니 험한 날씨를 진정시키기 위해 숙소에서 타온 커피 한 잔을 따랐다. 바람과 바람 사이를 틈타 문을 열고 근방에 계실 천지신명께 커피 한 모금을 권했다.
다랑쉬 오름에 오를 계획은 오늘이 아니라 어제다. 국립해녀박물관과 비자림을 둘러본 뒤 숙소로 정한 서귀포로 돌아가는 길에 들를 계획이었다.
근데 제주 공항에 도착하여 날씨 검색을 하면서 일정이 바뀌었다. 둘째 날부터 비와 눈이 내린다고 했다. 불가피하게 둘째 날에 가기로 한 올레 10길을 하루 앞당겼다.
공항에 내리는 대로 산방산을 향해 1시간을 달렸다. 산방산 아래로 펼쳐지는 사계해안길이 눈앞에 삼삼히 아른거렸다. 산방산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해안 길로 나갔다.
바다가 힘들여 찾아온 우리를 덥석 끌어안았다. 파도는 한없이 잔잔하고 날씨는 쾌청했다. 저 건너 형제섬이 어서 오라고 우리를 맞았고, 그 너머 마라도가 반가우이! 아는 체를 했다. 우리는 그들과 나란히 파도가 찰방대는 모래톱을 따라 걷다가, 발자국화석 반연지를 걷다가, 모래 둔덕에 피는 노란 갯국화 곁을 지나다가, 그러다가 우연히 오던 길을 돌아보면 그가 우뚝 서 있었다. 산방굴사가 있는 산방산.
우리의 처음 목표는 이 길을 걸어 두 시간 거리의 송악산을 돌아오는 일이다. 하지만 이 잔잔하고 햇빛 좋은 사계해안을 걸으며 목표를 바꾸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지금 여기를 마지막 목표지점으로 삼았다. 목표를 바꾸고 나자 우리는 조금 전에 지나쳤던 노란 갯국화를 다시 찾아가 어루만져 주고, 발자국 화석을 찾아가 빛나는 초록 이끼를 보아주고, 유리처럼 맑은 파도에 손을 적시며, 장난치며, 놀며, 따사로운 겨울 햇살을 즐겼다.
그러고 숙소로 돌아온 밤부터 함박눈이 내렸다.
눈은 창밖 동백나무숲을 뒤덮고, 그 너머 큰엉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를 틀어막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우리를 더욱 암울하게 하는 게 있었다. 폭설 경보 문자메시지였다.
“내일은 틀렸네 뭐.”
아내가 기어이 참았던 말을 했다.
눈은 그 밤부터 연속적으로 내려 지금까지 내리고 있다.
다랑쉬! 다랑쉬! 하며 제주를 찾아온 내 속을 알았을까. 아니면 한잔 얻어잡수신 커피 때문일까. 눈보라가 약해지는 틈을 타 우리는 다람쥐길 같은 소로를 따라 올랐다.
그 예쁜 달덩이 분화구 앞에 섰을 때다. 기어이 제주 바람이 본색을 드러냈다. 북쪽 들판을 거칠게 달려와 껑충한 나를 분화구 비탈에 집어던졌다. 그 바람은 라 만차 평원에서 풍차 마을로 거칠게 불어오던 돈키호테 바람과 너무도 흡사했다. 비탈의 억새풀을 그러잡지 않았다면 나는 분화구에 빠져 영영 돌아오지 못했을 거다. 아, 제주 바람이여! 다랑쉬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