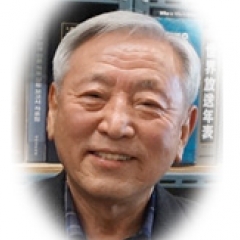[권영상 작가님] 겨울을 건너는 방식
[권영상 작가님] 겨울을 건너는 방식
by 권영상 작가님 2022.02.17

점심 뒤면 대개 동네 길을 한 바퀴 돈다. 그건 순전히 코로나가 번창하면서부터다. 사람을 만나러 나갈 기회가 적어진 만큼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 시간의 대부분을 컴퓨터 앞에서 보내는 버릇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함이다.
그러나 추운 바깥나들이는 나를 불편하게 한다. 나처럼 몸이 마른 체형은 추위에 약하다. 스치는 바람에도 온몸을 부르르 떤다. 상체가 약해 더욱 겨울몸살이 심하다.
그런데도 올겨울은 다르다. 외출이 즐거울 정도다. 옷이 좋아진 때문도 있겠지만 뭐니 뭐니 해도 내의 덕분이다. 내의를 입은 적이 가물가물하다. 안 입은 지 대충 30여 년은 된 것 같다. 그때 그 허세를 떨던 젊은 시절엔 메리야스 내의를 입는 게 아내 보기에 창피했다. 끝내 나는 속으로는 떨면서 바지 하나로 안 추운 척 겨울을 났다.
근데 너무도 우연한 일이다. 장롱 깊숙이 넣어둔 내의가 올겨울 내 눈에 띄었고, 연습 삼아 한번 입어 본 것이 실전이 되었다. 사람 품에 안기는 것처럼 따뜻했다. 나는 밖으로 나갈 때마다 그 따뜻한 달콤함에 빠져 그게 뭐 별거라고 내의를 챙겨 입는다. 코로나용 마스크를 한다. 두툼한 모자를 쓴다. 목도리를 하고 그예 집을 나선다.
기온이 영하로 깊숙이 떨어지는 날이어도 춥지 않다. 젊은 시절, 가벼이 옷을 입고 멋대가리를 피우던 게 후회된다. 그러느라 추위에 떤 건 결국 내 몸이었다.
이제는 점심 이후의 나들이가 오히려 기다려진다. 빵빵하게 몸을 조여 주는 내의의 팽팽한 감촉이 좋다.
집을 나왔으니 할 일이 있다. 아내가 있어 안에서 못한 이들에게 전화를 거는 일이다. 이 시간이 내게는 세상 사람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유일한 시간이다. 오늘은 멀리 함안에 사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 중에 그이도 나처럼 심하게 추위를 탄다는 걸 알았다. 집이 동향이라 점심 식사 후엔 햇살이 드는 가까운 카페에 나가 책을 읽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바라는 게 있다면 따뜻한 곳에 가 겨울을 나고 왔으면, 하는 게 소원이란다.
“마음 같으면 베트남이나 필리핀쯤에 가 겨울을 나고 왔으면 좋겠어.” 그런다.
추위를 몹시 타는 이들에겐 되지도 않을 호사스런 꿈이지만 어쨌든 내게도 그런 꿈이 있다.
나는 싱겁게 내의 입은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자 대뜸 그는 자신의 토시 이야기를 했다. 결혼한 딸이 아버지 추위 타는 걸 알고 초록 털실로 짜준 무릎까지 올라오는 토시가 있는데 그걸 애용한단다. 바깥일을 하거나 가벼운 산책을 할 때엔 토시 없이 못 나간다 했다. 나는 그가 초록 털실토시로 겨울을 잘 이겨낼 것을 당부하며 전화를 끊었다.
‘목마와 숙녀’로 잘 알려진 시인 박인환에게는 멋진 외투가 있었다. 그는 생활이 궁핍해 겨울이면 냉방에 살면서도 외투를 입고 거리를 활보하고 싶어 겨울이 늦게 오는 걸 괜히 투덜댔다고 한다. 김소운의 수필 ‘외투’에는 이런 글이 있다. 바지저고리 차림으로 하얼빈에서 추운 북만주로 가는 청마를 보고 벗어줄 외투가 없자, 만년필 ‘콩크링’을 쥐여 보냈다고 한다. 청마는 어쩌면 그 만년필의 힘으로 북만주의 겨울을 잘 견뎌냈을지도 모르겠다.
겨울이란 오래 참아내는 계절이다. 그러기 위해 사람들은 저마다 겨울을 건너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 비록 그것이 현실적으로 턱없이 소박하거나 가당찮은 것일지라도 그것에 의지해 추위를 견딘다.
올겨울엔 무엇보다 메리야스 내의가 있어 좋다. 그래서 겨울이 덜 두렵다.
그러나 추운 바깥나들이는 나를 불편하게 한다. 나처럼 몸이 마른 체형은 추위에 약하다. 스치는 바람에도 온몸을 부르르 떤다. 상체가 약해 더욱 겨울몸살이 심하다.
그런데도 올겨울은 다르다. 외출이 즐거울 정도다. 옷이 좋아진 때문도 있겠지만 뭐니 뭐니 해도 내의 덕분이다. 내의를 입은 적이 가물가물하다. 안 입은 지 대충 30여 년은 된 것 같다. 그때 그 허세를 떨던 젊은 시절엔 메리야스 내의를 입는 게 아내 보기에 창피했다. 끝내 나는 속으로는 떨면서 바지 하나로 안 추운 척 겨울을 났다.
근데 너무도 우연한 일이다. 장롱 깊숙이 넣어둔 내의가 올겨울 내 눈에 띄었고, 연습 삼아 한번 입어 본 것이 실전이 되었다. 사람 품에 안기는 것처럼 따뜻했다. 나는 밖으로 나갈 때마다 그 따뜻한 달콤함에 빠져 그게 뭐 별거라고 내의를 챙겨 입는다. 코로나용 마스크를 한다. 두툼한 모자를 쓴다. 목도리를 하고 그예 집을 나선다.
기온이 영하로 깊숙이 떨어지는 날이어도 춥지 않다. 젊은 시절, 가벼이 옷을 입고 멋대가리를 피우던 게 후회된다. 그러느라 추위에 떤 건 결국 내 몸이었다.
이제는 점심 이후의 나들이가 오히려 기다려진다. 빵빵하게 몸을 조여 주는 내의의 팽팽한 감촉이 좋다.
집을 나왔으니 할 일이 있다. 아내가 있어 안에서 못한 이들에게 전화를 거는 일이다. 이 시간이 내게는 세상 사람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유일한 시간이다. 오늘은 멀리 함안에 사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 중에 그이도 나처럼 심하게 추위를 탄다는 걸 알았다. 집이 동향이라 점심 식사 후엔 햇살이 드는 가까운 카페에 나가 책을 읽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바라는 게 있다면 따뜻한 곳에 가 겨울을 나고 왔으면, 하는 게 소원이란다.
“마음 같으면 베트남이나 필리핀쯤에 가 겨울을 나고 왔으면 좋겠어.” 그런다.
추위를 몹시 타는 이들에겐 되지도 않을 호사스런 꿈이지만 어쨌든 내게도 그런 꿈이 있다.
나는 싱겁게 내의 입은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자 대뜸 그는 자신의 토시 이야기를 했다. 결혼한 딸이 아버지 추위 타는 걸 알고 초록 털실로 짜준 무릎까지 올라오는 토시가 있는데 그걸 애용한단다. 바깥일을 하거나 가벼운 산책을 할 때엔 토시 없이 못 나간다 했다. 나는 그가 초록 털실토시로 겨울을 잘 이겨낼 것을 당부하며 전화를 끊었다.
‘목마와 숙녀’로 잘 알려진 시인 박인환에게는 멋진 외투가 있었다. 그는 생활이 궁핍해 겨울이면 냉방에 살면서도 외투를 입고 거리를 활보하고 싶어 겨울이 늦게 오는 걸 괜히 투덜댔다고 한다. 김소운의 수필 ‘외투’에는 이런 글이 있다. 바지저고리 차림으로 하얼빈에서 추운 북만주로 가는 청마를 보고 벗어줄 외투가 없자, 만년필 ‘콩크링’을 쥐여 보냈다고 한다. 청마는 어쩌면 그 만년필의 힘으로 북만주의 겨울을 잘 견뎌냈을지도 모르겠다.
겨울이란 오래 참아내는 계절이다. 그러기 위해 사람들은 저마다 겨울을 건너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 비록 그것이 현실적으로 턱없이 소박하거나 가당찮은 것일지라도 그것에 의지해 추위를 견딘다.
올겨울엔 무엇보다 메리야스 내의가 있어 좋다. 그래서 겨울이 덜 두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