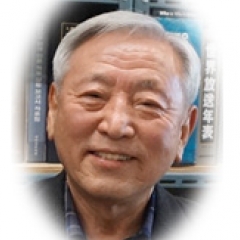[권영상 작가님] 봄이 피어나는 추억
[권영상 작가님] 봄이 피어나는 추억
by 권영상 작가님 2022.03.03

창가에 봄이 자라고 있다.
가장 추운 날에, 다가올 봄을 생각하며 물병 위에 양파를 얹어두었다. 그 무렵만 해도 우리가 살던 이곳엔 봄이라곤 없었다. 오직 있다면 영하 10도거나 11도를 오르내리는 추위와 추운 바람뿐이었다. 장갑도 하나면 됐는데 장갑 안에 흰 면장갑을 하나 더 껴야 손이 시리지 않는 매운 겨울만 있었다.
겨울의 거실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반까지 불과 서너 시간 동안 햇볕이 들어온다. 건너편에 새로 선 고층 아파트 때문이다. 겨울이면 햇볕 귀한 걸 몸으로 겪는다. 햇볕이 가면 행복도 간다. 행복이 가면 나는 속절없이 중얼거린다. 얼른 봄이 왔으면, 하고.
볕 들 시각이면 나는 그때에 맞추어 책 한 권 집어 들고 거실로 나간다. 거실 바닥에 수북하니 쌓인 햇볕 무더기에 손을 들이민다. 정미소에서 갓 나온 도정미처럼 따스하다. 따스한 볕 속에 앉아 책을 읽고 있을 때다. 베란다에서 바스락, 소리가 났다. 나는 소리 난 곳의 기억을 더듬어 문을 열고 나갔다. 신문을 덮어 둔 감자 박스다. 신문을 들어 올렸다.
아! 감자순, 너였구나!
조금씩 머물렀다 가는 겨울 볕에 감자가 봄을 느낀 모양이었다. 하얀 싹이 길쭉길쭉 나왔다. 그 녀석들이 함께 넣어놓은 양파 껍질을 건들자 양파가 바스락, 놀랐던 모양이다. 감자 순을 다 떼어내고 일어서며 양파 하나를 집어 들었다. 유리병을 찾아 물을 붓고 그 위에 양파를 얹었다. 그것은 오래전, 파란 봄을 키우던 기억 때문이다. 내 방 창턱에 올려두고 거기에 정신을 쏟는 사이 하얀 뿌리가 나오고, 작지만 파란 봄이 자라 올랐다.
집에 봄이 자라면 그 집 사람들 마음에도 봄이 자란다. 길을 나서면 봄이 보였다. 아침마다 오르는 산자락에 늙은 은사시나무가 바람에 쓰러졌다. 우듬지 가지에 어렴풋한 연둣빛 봄이 얼비쳤다. 꽃눈이 젖꼭지처럼 통통했다. 그중 한 가지를 꺾어들고 와 머그컵에 꽂아두었다. 하룻밤 자고 나자, 가지 껍질이 제법 파래졌다. 사나흘 뒤면 금방 봄눈이라도 틔워 올릴 듯 가지가 부풀어 오른다.
이쯤이면 봄 맞을 준비를 다 해 놓은 셈이다. 다 아는 일이지만 때가 되면 겨울은 떠난다. 겨울이 떠나간 자리에 다시 봄이 피어난다는 추억은 누구에게나 있다. 봄은 오래된 추억처럼 추운 겨울이 물러간 자리에서 새롭게 태어난다.
새로 오는 봄은, 실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먼저 온다.
오늘 점심을 먹고 마을 앞 분수를 찾아갔다. 분수 주변 남향 잔디 언덕에 사내 하나가 비스듬히 누워 햇빛 바라기를 하고 있다. 나는 그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이쪽 매화나무숲 앞을 걸었다. 발아래 파란 풀꽃 하나가 눈에 띄었다. 밥풀만 한 꽃마리, 글쎄 작아도 너무 작은 꽃마리 꽃이었다. 처음 보아내기 어렵지 한번 보고나니 주변이 온통 꽃마리 꽃 천지다. 내가 무심코 걸어온 마른 풀밭이 모두 꽃마리 꽃밭이었고, 지금 밟고 있는 내 신발 밑이 모두 꽃마리 꽃자리다.
봄은 집 밖에서도 집안에서도 자라고 있다. 봄은 추위가 절정에 이르는 그 순간부터 겨울이 기운다는 걸 안다. 그런 까닭에 바람 많은 높은 은사시나무 우듬지에도, 볕드는 매화나무숲 아래 마른 풀밭에도 움트기 시작한다. 양파도 깨끗한 유리병 위에서 어느 날인가 가벼운 봄빛의 초록 기쁨을 내게 선물하리라. 이 시간을 쭈욱 따라가면 그 기쁨에 가닿을 거다. 그때면 나는, 이미 떠나간 겨울 추억에 잠기겠다.
가장 추운 날에, 다가올 봄을 생각하며 물병 위에 양파를 얹어두었다. 그 무렵만 해도 우리가 살던 이곳엔 봄이라곤 없었다. 오직 있다면 영하 10도거나 11도를 오르내리는 추위와 추운 바람뿐이었다. 장갑도 하나면 됐는데 장갑 안에 흰 면장갑을 하나 더 껴야 손이 시리지 않는 매운 겨울만 있었다.
겨울의 거실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반까지 불과 서너 시간 동안 햇볕이 들어온다. 건너편에 새로 선 고층 아파트 때문이다. 겨울이면 햇볕 귀한 걸 몸으로 겪는다. 햇볕이 가면 행복도 간다. 행복이 가면 나는 속절없이 중얼거린다. 얼른 봄이 왔으면, 하고.
볕 들 시각이면 나는 그때에 맞추어 책 한 권 집어 들고 거실로 나간다. 거실 바닥에 수북하니 쌓인 햇볕 무더기에 손을 들이민다. 정미소에서 갓 나온 도정미처럼 따스하다. 따스한 볕 속에 앉아 책을 읽고 있을 때다. 베란다에서 바스락, 소리가 났다. 나는 소리 난 곳의 기억을 더듬어 문을 열고 나갔다. 신문을 덮어 둔 감자 박스다. 신문을 들어 올렸다.
아! 감자순, 너였구나!
조금씩 머물렀다 가는 겨울 볕에 감자가 봄을 느낀 모양이었다. 하얀 싹이 길쭉길쭉 나왔다. 그 녀석들이 함께 넣어놓은 양파 껍질을 건들자 양파가 바스락, 놀랐던 모양이다. 감자 순을 다 떼어내고 일어서며 양파 하나를 집어 들었다. 유리병을 찾아 물을 붓고 그 위에 양파를 얹었다. 그것은 오래전, 파란 봄을 키우던 기억 때문이다. 내 방 창턱에 올려두고 거기에 정신을 쏟는 사이 하얀 뿌리가 나오고, 작지만 파란 봄이 자라 올랐다.
집에 봄이 자라면 그 집 사람들 마음에도 봄이 자란다. 길을 나서면 봄이 보였다. 아침마다 오르는 산자락에 늙은 은사시나무가 바람에 쓰러졌다. 우듬지 가지에 어렴풋한 연둣빛 봄이 얼비쳤다. 꽃눈이 젖꼭지처럼 통통했다. 그중 한 가지를 꺾어들고 와 머그컵에 꽂아두었다. 하룻밤 자고 나자, 가지 껍질이 제법 파래졌다. 사나흘 뒤면 금방 봄눈이라도 틔워 올릴 듯 가지가 부풀어 오른다.
이쯤이면 봄 맞을 준비를 다 해 놓은 셈이다. 다 아는 일이지만 때가 되면 겨울은 떠난다. 겨울이 떠나간 자리에 다시 봄이 피어난다는 추억은 누구에게나 있다. 봄은 오래된 추억처럼 추운 겨울이 물러간 자리에서 새롭게 태어난다.
새로 오는 봄은, 실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먼저 온다.
오늘 점심을 먹고 마을 앞 분수를 찾아갔다. 분수 주변 남향 잔디 언덕에 사내 하나가 비스듬히 누워 햇빛 바라기를 하고 있다. 나는 그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이쪽 매화나무숲 앞을 걸었다. 발아래 파란 풀꽃 하나가 눈에 띄었다. 밥풀만 한 꽃마리, 글쎄 작아도 너무 작은 꽃마리 꽃이었다. 처음 보아내기 어렵지 한번 보고나니 주변이 온통 꽃마리 꽃 천지다. 내가 무심코 걸어온 마른 풀밭이 모두 꽃마리 꽃밭이었고, 지금 밟고 있는 내 신발 밑이 모두 꽃마리 꽃자리다.
봄은 집 밖에서도 집안에서도 자라고 있다. 봄은 추위가 절정에 이르는 그 순간부터 겨울이 기운다는 걸 안다. 그런 까닭에 바람 많은 높은 은사시나무 우듬지에도, 볕드는 매화나무숲 아래 마른 풀밭에도 움트기 시작한다. 양파도 깨끗한 유리병 위에서 어느 날인가 가벼운 봄빛의 초록 기쁨을 내게 선물하리라. 이 시간을 쭈욱 따라가면 그 기쁨에 가닿을 거다. 그때면 나는, 이미 떠나간 겨울 추억에 잠기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