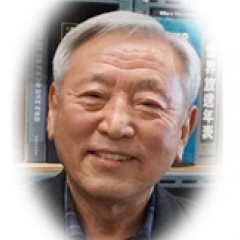[권영상 작가님] 꽃씨 온상을 만들며
[권영상 작가님] 꽃씨 온상을 만들며
by 권영상 작가님 2022.03.24

쯔박쯔박쯔박쯔박!
모과나무에 날아온 박새가 요란하게 운다. 목소리가 또렷하면서도 울음이 길다.
조금 전에 안성으로 내려왔다. 적막이 도는 시골 뜰 안에 난데없이 박새 소리라니! 마치 어느 낯선 별에 도착한 듯 신비한 느낌이다. 보통 때는 쯔박쯔박, 두 박자씩 끊어 우는데 지금은 아니다. 연속적으로 운다. 울음소리에서 뭔가 막 다가오는 임박함과 다급함이 묻어난다. 가까이 밀려들어오는 봄 탓인 듯하다. 박새 마음이 바빠진 것 같다. 머지않아 짝을 만나고, 둥지를 틀고, 알을 낳아 새끼 칠 일을 생각하는 모양이다.
바깥 기둥에 달아놓은 온도계를 본다. 영상 16도다.
박새를 따라 나도 괜히 마음이 바빠진다. 이맘쯤에 해야 할 일이 있다. 꽃씨 온상이다. 꽃씨 온상을 하는 김에 내처 그 한켠에 상추며 쑥갓 씨앗도 넣을 생각이다. 텃밭 농사를 하면서 배운 게 있다. 적기다. 씨앗을 넣는데도 적기가 있고, 웃거름을 넣거나 수확하는 일에도 적기가 있다. 파종도 작물마다 적기가 다 다르다. 적기를 놓치면 훗날 거두어들일 것이 없어진다. 인디언 속담에 봄날에는 이야기를 즐겨 하는 사람을 가까이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이야기에 정신을 팔다 보면 때를 놓치기 때문이다.
삽을 꺼내어 남녘 밭 따스한 자리에 신문지 석장 크기의 온상을 만든다. 대충 자리를 정리하고 삽을 든다. 삽날이 무른 땅속을 쑥쑥 파고든다. 흙덩이를 손으로 툭툭 부수고 판판하게 흙을 편다. 비 끝이라 흙냄새가 좋다.
손가락으로 꽃씨 뿌릴 골을 낸다. 오래전부터 쭉 심어온 프렌치 메리골드 씨앗을 뿌린다. 해마다 집 둘레에 빙 돌아가며 울타리 삼아 심어왔다. 허브식물이라 향기가 좋고, 한번 꽃 피면 서리 내릴 때까지 핀다. 우리 집에 해바라기가 한창 폈을 때다. 뜰아래 길을 지나가던 여자아이가 ‘저기 저 집 해바라기별 같애.’ 그랬다. 그 후, 나는 가급적이면 이 별에 해바라기 심는 걸 멈추지 않는다. 키가 크고, 꽃판이 둥근 해바라기에는 먼 이국의 냄새가 난다.
지난해엔 백일홍, 봉숭아, 접시꽃이며 채송화를 가득 심었다. 주로 이름 있는 꽃보다는 우리 정서에 맞는 소박한 꽃들이다. 남들과 이야기하기 좋은 꽃이다. 비피더스니 포인세티어니 카모밀레라는 이름의 꽃들은 남들과 아무리 그 꽃 이야기를 해도 낯선 꽃이라 소통이 안 된다. 프렌치 메리골드 역시 이름이 낯설어 대화나 문학 속에 끌어들이기가 크게 좋은 꽃 이름이 아니다. 그러나 해바라기니 백일홍, 분꽃, 봉숭아, 접시꽃은 정서적 공감대를 갖고 있는 꽃이라 대화가 쉽고 얘기를 나눌수록 정다워진다.
이들 꽃씨를 다 넣고 상추와 쑥갓 씨앗도 넣었다. 이번엔 좀 대범하게 고추씨와 호박씨도 한 줄씩 넣었다. 이제 이들은 내달 하순이면 본밭에 낼 수 있다. 그때가 그들의 적기다. 온상에 비닐을 덮고 일어서자, 문득 떠오르는 나의 적기가 있다.
오래전 일이지만 내게 초등학교 생활은 늘 고되었다. 손위 누나가 졸업하기 전에 나를 데리고 다니라며 아버지는 내 나이 6살에 초등학교에 보내셨다. 당연히 나는 고단했다. 그런데 우연일까. 중학교를 마칠 무렵 어머니는 병환으로 장기 입원을 하셨고, 나는 진학을 중단한 채 3년을 허송세월했다. 그 뒤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때에야 나도 남들이 하는 학급 임원도 하고, 세상을 보는 눈도 생기고, 마음도 담대해졌다.
어머니의 병환이 나의 적기를 고쳐주신 셈이다. 남들보다 두어 살 어린 나이로 고단하게 학창 시절을 마쳤다면 나의 오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고비고비 적기를 생각한다.
모과나무에 날아온 박새가 요란하게 운다. 목소리가 또렷하면서도 울음이 길다.
조금 전에 안성으로 내려왔다. 적막이 도는 시골 뜰 안에 난데없이 박새 소리라니! 마치 어느 낯선 별에 도착한 듯 신비한 느낌이다. 보통 때는 쯔박쯔박, 두 박자씩 끊어 우는데 지금은 아니다. 연속적으로 운다. 울음소리에서 뭔가 막 다가오는 임박함과 다급함이 묻어난다. 가까이 밀려들어오는 봄 탓인 듯하다. 박새 마음이 바빠진 것 같다. 머지않아 짝을 만나고, 둥지를 틀고, 알을 낳아 새끼 칠 일을 생각하는 모양이다.
바깥 기둥에 달아놓은 온도계를 본다. 영상 16도다.
박새를 따라 나도 괜히 마음이 바빠진다. 이맘쯤에 해야 할 일이 있다. 꽃씨 온상이다. 꽃씨 온상을 하는 김에 내처 그 한켠에 상추며 쑥갓 씨앗도 넣을 생각이다. 텃밭 농사를 하면서 배운 게 있다. 적기다. 씨앗을 넣는데도 적기가 있고, 웃거름을 넣거나 수확하는 일에도 적기가 있다. 파종도 작물마다 적기가 다 다르다. 적기를 놓치면 훗날 거두어들일 것이 없어진다. 인디언 속담에 봄날에는 이야기를 즐겨 하는 사람을 가까이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이야기에 정신을 팔다 보면 때를 놓치기 때문이다.
삽을 꺼내어 남녘 밭 따스한 자리에 신문지 석장 크기의 온상을 만든다. 대충 자리를 정리하고 삽을 든다. 삽날이 무른 땅속을 쑥쑥 파고든다. 흙덩이를 손으로 툭툭 부수고 판판하게 흙을 편다. 비 끝이라 흙냄새가 좋다.
손가락으로 꽃씨 뿌릴 골을 낸다. 오래전부터 쭉 심어온 프렌치 메리골드 씨앗을 뿌린다. 해마다 집 둘레에 빙 돌아가며 울타리 삼아 심어왔다. 허브식물이라 향기가 좋고, 한번 꽃 피면 서리 내릴 때까지 핀다. 우리 집에 해바라기가 한창 폈을 때다. 뜰아래 길을 지나가던 여자아이가 ‘저기 저 집 해바라기별 같애.’ 그랬다. 그 후, 나는 가급적이면 이 별에 해바라기 심는 걸 멈추지 않는다. 키가 크고, 꽃판이 둥근 해바라기에는 먼 이국의 냄새가 난다.
지난해엔 백일홍, 봉숭아, 접시꽃이며 채송화를 가득 심었다. 주로 이름 있는 꽃보다는 우리 정서에 맞는 소박한 꽃들이다. 남들과 이야기하기 좋은 꽃이다. 비피더스니 포인세티어니 카모밀레라는 이름의 꽃들은 남들과 아무리 그 꽃 이야기를 해도 낯선 꽃이라 소통이 안 된다. 프렌치 메리골드 역시 이름이 낯설어 대화나 문학 속에 끌어들이기가 크게 좋은 꽃 이름이 아니다. 그러나 해바라기니 백일홍, 분꽃, 봉숭아, 접시꽃은 정서적 공감대를 갖고 있는 꽃이라 대화가 쉽고 얘기를 나눌수록 정다워진다.
이들 꽃씨를 다 넣고 상추와 쑥갓 씨앗도 넣었다. 이번엔 좀 대범하게 고추씨와 호박씨도 한 줄씩 넣었다. 이제 이들은 내달 하순이면 본밭에 낼 수 있다. 그때가 그들의 적기다. 온상에 비닐을 덮고 일어서자, 문득 떠오르는 나의 적기가 있다.
오래전 일이지만 내게 초등학교 생활은 늘 고되었다. 손위 누나가 졸업하기 전에 나를 데리고 다니라며 아버지는 내 나이 6살에 초등학교에 보내셨다. 당연히 나는 고단했다. 그런데 우연일까. 중학교를 마칠 무렵 어머니는 병환으로 장기 입원을 하셨고, 나는 진학을 중단한 채 3년을 허송세월했다. 그 뒤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때에야 나도 남들이 하는 학급 임원도 하고, 세상을 보는 눈도 생기고, 마음도 담대해졌다.
어머니의 병환이 나의 적기를 고쳐주신 셈이다. 남들보다 두어 살 어린 나이로 고단하게 학창 시절을 마쳤다면 나의 오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고비고비 적기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