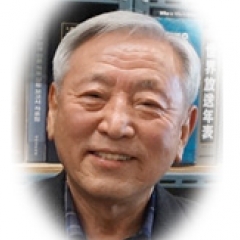[권영상 작가님] 꽃숲에서 동박새를 만나다
[권영상 작가님] 꽃숲에서 동박새를 만나다
by 권영상 작가님 2022.04.14

4월, 꽃이 지천이다.
겨울을 견뎌낸 목숨들을 위해 자연이 보내는 찬사가 아닐까 싶다. 작은 미물에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겨울이란 누구에게나 혹독하다. 목숨을 위협하는 추위와 미물들에게 물 한 방울 내어주지 않는 건기의 목마름은 잔인하다.
먼바다 건너 남지나 반도에 사는 각시메뚜기는 바람을 따라 북상해 우리나라에서 어른벌레로 겨울을 난다. 그들은 다른 곤충들이 알을 낳고 떠나는 것과 달리 낙엽 더미나 돌 틈에서 맨몸으로 추위의 강을 건넌다. 추위가 한계점에 이르면 몸 안의 체액이 얼어 죽고 마는 각시메뚜기의 눈 밑에는 지워지지 않는 슬픈 눈물자국이 있다.
4월에 피는 꽃은 그들의 아픔을 달래주는 축복의 선물이다.
마을마다 꽃이 한창이다. 매화가 피더니 산수유가 피고, 살구꽃이 피더니 목련이 피고, 목련이 피는 걸 보더니 벚꽃이 한창이다. 산에 기거하는 나무들은 이들보다 더 봄에 민감하다. 4월이 오기도 전에 생강나무 꽃이 피고, 덩달아 산벚이 핀다.
생강나무 꽃이 몹시 어우러져 피는 동네 산골짝을 나는 안다. 생강나무가 산골짝을 노란 꽃으로 물들일 때면 좀 멀긴 해도 그곳을 찾아간다. 그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나를 이끈다. 달콤하고, 향긋하고, 산뜻하다. 하지만 그곳이 가까워지면 꽃 냄새가 달고, 진하고, 그윽하다. 꽃 냄새라기보다 꿀 냄새에 가깝다.
생강나무 골짝이 마치 꿀단지 속 같다.
그 꽃숲 그늘을 밟으며 걸어 들어갈 때다. 생강나무 꽃 사이를 바지런하게 건너뛰는 새가 있다. 쉬지 않고 꽃꿀을 빠는 새는 보기 드문 초록빛이다. 파스텔 색조를 띠는 올리브 녹색. 나는 그 낯설고 신비스러운 초록빛에 탄성을 질렀다. 세상에 초록빛 새라니!
휴대폰을 꺼내 검색했다. 말로만 듣던 동박새였다. 우리나라 남해안과 도서 지방에 산다는 동박새가 여기 서울의 도심으로 날아온 거다. 몸이 통통한, 개똥지빠귀를 닮았으나 조금 작다. 한두 마리가 아니었다. 뾰족한 부리 끝을 꽃 속에 집어넣어 꿀을 빨고 있다.
이들 역시 꽃꿀 냄새에 이끌려 이 골짝으로 모여들었을 거다. 그러고 보니 늦은 가을에 찾아온 개똥지빠귀가 보이지 않는다. 4월 꽃이 필 무렵, 남쪽에서 날아온 동박새들에게 자리를 넘겨주고 그들은 먼 시베리아로 갔다.
지난해 이 무렵이다. 여수에서 남으로 남으로 내려간 막다른 산부리에서 향일암을 만났고, 나는 그 근방에서 이틀을 머물렀다. 그때 동백꽃이 미치도록 피는 꽃숲을 이틀을 거닐었고, 대양이 보이는 꽃숲에서 이틀을 쑥을 캤다. 그때에도 동백나무에 매여 살아 동박생이라 불린다는 동박새를 나는 보지 못했다. 근데 그 동박새를 엉뚱하게 서울에서 만났다.
삐삐삐삐, 삐삐삐삐…….
생강나무숲에서 동박새가 네 음절씩 끊어 운다.
울음소리에 서러움이 묻어있다. 왕위를 조카에게 넘겨주기 싫어 자식을 죽이라는 왕의 명을 받은 왕제가 그 명을 받을 수 없어 스스로 죽어 동백나무가 되고, 그 아들은 동박새가 되어 동백나무를 찾아 돌아왔다는 전설 때문일까. 동박새 울음이 애절하다.
온몸이 초록이고 가슴은 뽀얀 연두색이다. 볼수록 신비하다. 눈가엔 각시메뚜기의 눈물자국처럼 하얀 눈물 고리가 있는 동박새를 4월의 생강나무 꽃숲에서 만난다.
겨울을 무사히 잘 넘긴 축복의 선물이겠다.
겨울을 견뎌낸 목숨들을 위해 자연이 보내는 찬사가 아닐까 싶다. 작은 미물에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겨울이란 누구에게나 혹독하다. 목숨을 위협하는 추위와 미물들에게 물 한 방울 내어주지 않는 건기의 목마름은 잔인하다.
먼바다 건너 남지나 반도에 사는 각시메뚜기는 바람을 따라 북상해 우리나라에서 어른벌레로 겨울을 난다. 그들은 다른 곤충들이 알을 낳고 떠나는 것과 달리 낙엽 더미나 돌 틈에서 맨몸으로 추위의 강을 건넌다. 추위가 한계점에 이르면 몸 안의 체액이 얼어 죽고 마는 각시메뚜기의 눈 밑에는 지워지지 않는 슬픈 눈물자국이 있다.
4월에 피는 꽃은 그들의 아픔을 달래주는 축복의 선물이다.
마을마다 꽃이 한창이다. 매화가 피더니 산수유가 피고, 살구꽃이 피더니 목련이 피고, 목련이 피는 걸 보더니 벚꽃이 한창이다. 산에 기거하는 나무들은 이들보다 더 봄에 민감하다. 4월이 오기도 전에 생강나무 꽃이 피고, 덩달아 산벚이 핀다.
생강나무 꽃이 몹시 어우러져 피는 동네 산골짝을 나는 안다. 생강나무가 산골짝을 노란 꽃으로 물들일 때면 좀 멀긴 해도 그곳을 찾아간다. 그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나를 이끈다. 달콤하고, 향긋하고, 산뜻하다. 하지만 그곳이 가까워지면 꽃 냄새가 달고, 진하고, 그윽하다. 꽃 냄새라기보다 꿀 냄새에 가깝다.
생강나무 골짝이 마치 꿀단지 속 같다.
그 꽃숲 그늘을 밟으며 걸어 들어갈 때다. 생강나무 꽃 사이를 바지런하게 건너뛰는 새가 있다. 쉬지 않고 꽃꿀을 빠는 새는 보기 드문 초록빛이다. 파스텔 색조를 띠는 올리브 녹색. 나는 그 낯설고 신비스러운 초록빛에 탄성을 질렀다. 세상에 초록빛 새라니!
휴대폰을 꺼내 검색했다. 말로만 듣던 동박새였다. 우리나라 남해안과 도서 지방에 산다는 동박새가 여기 서울의 도심으로 날아온 거다. 몸이 통통한, 개똥지빠귀를 닮았으나 조금 작다. 한두 마리가 아니었다. 뾰족한 부리 끝을 꽃 속에 집어넣어 꿀을 빨고 있다.
이들 역시 꽃꿀 냄새에 이끌려 이 골짝으로 모여들었을 거다. 그러고 보니 늦은 가을에 찾아온 개똥지빠귀가 보이지 않는다. 4월 꽃이 필 무렵, 남쪽에서 날아온 동박새들에게 자리를 넘겨주고 그들은 먼 시베리아로 갔다.
지난해 이 무렵이다. 여수에서 남으로 남으로 내려간 막다른 산부리에서 향일암을 만났고, 나는 그 근방에서 이틀을 머물렀다. 그때 동백꽃이 미치도록 피는 꽃숲을 이틀을 거닐었고, 대양이 보이는 꽃숲에서 이틀을 쑥을 캤다. 그때에도 동백나무에 매여 살아 동박생이라 불린다는 동박새를 나는 보지 못했다. 근데 그 동박새를 엉뚱하게 서울에서 만났다.
삐삐삐삐, 삐삐삐삐…….
생강나무숲에서 동박새가 네 음절씩 끊어 운다.
울음소리에 서러움이 묻어있다. 왕위를 조카에게 넘겨주기 싫어 자식을 죽이라는 왕의 명을 받은 왕제가 그 명을 받을 수 없어 스스로 죽어 동백나무가 되고, 그 아들은 동박새가 되어 동백나무를 찾아 돌아왔다는 전설 때문일까. 동박새 울음이 애절하다.
온몸이 초록이고 가슴은 뽀얀 연두색이다. 볼수록 신비하다. 눈가엔 각시메뚜기의 눈물자국처럼 하얀 눈물 고리가 있는 동박새를 4월의 생강나무 꽃숲에서 만난다.
겨울을 무사히 잘 넘긴 축복의 선물이겠다.